숨터학당(學堂)-진리를 깨달아 자유를....나는 나다.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8) 본문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8)
박사논문
2015. 8. 25.
다석사상, 돈오돈수, 동오점수, 보조국사, 없이 계시는 하느님, 유영모, 윤정현, 지눌
성공회 수동교회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8)
3.2.3.3.1.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
자기 깨달음의 사고는 동양 종교와 철학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자기 깨달음은 유교의 자기 수신(修身)을 통해서, 불교의 득도(得道)를 통하여, 직관(直觀)적인 진리의 깨달음을 통해서, 그리고 도교의 무위(無爲)를 통해서 자아의 근원적인 깨달음을 나타낸다. 진리의 깨달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적이고 지성적이며 실천적인 삶의 자기 수신(修身)의 훈련과정을 통해서 얻어진다. 깨달음에 대한 사고는 특히 선불교(禪佛敎)에서 강조된다.
선불교에는 깨달음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득도(得道)라고 말하는 깨달음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지속 되어왔다. 불현듯 깨닫는 돈오(頓悟)와 천천히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점오(漸悟)의 방법이 있다. 5조 홍인(弘忍) 선사(禪師)의 제자 신수(神秀)는 북송(北宋)에서 점교(漸敎)를 설립한 반면에, 남송(南宋)에서는 혜능(慧能, 638-713)이 돈교(頓敎)를 세웠다. 점교(漸敎)과 돈교(頓敎)는 각기 서로 다른 방법으로 깨달음을 가르쳐왔다.
당(唐)나라 때, 두 위대한 선사가 나타났다. 천태종(天台宗)에는 담연(湛然, 711-782)이고, 화엄종(華嚴宗)에서는 징관(澄觀, 737-838) 이다. 특히 징관은 불교의 새로운 흐름에 있어 대표적인 위대한 선사였다. 종밀(宗密, 780-841)은 징관(澄觀)의 화엄사상(華嚴思想)의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남종(南宗) 신회(神會)의 후계자이기도 하다. 또한 종밀(宗密)은 한국의 위대한 선사 지눌(知訥, 1153-1210)의 선사상(禪思想)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인물이다.
돈오점수(頓悟漸修)의 입장에 서있는 다석 유영모의 사상을 연구하기 위해 지눌의 선사상(禪思想)에 주목하고자 한다. 종밀은 종(宗)과 교(敎)를 화합 (和合)하는 주장을 하였다. 한편으로 종밀은 종(宗)과 교(敎)의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근본적인 사상을 설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별한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을 융화하려고 하였다. 종밀은 선종 3가(家) 모두의 가르침은 궁극적으로는 본성(本性)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종3가의 기본적인 교리 유형을 분류하고 선종 (禪宗)의 주요 세 분파의 가르침을 조화하여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을 구체적으로 화합(和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종밀의 선(禪)과 교(敎)의 일치사상은 선종을 따르는 사람들, 특히, 더 근본적인 과정을 따르려고 했던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근본적인 선종을 따르는 사람들은 종밀의 선교(禪敎)의 일치사상과 종밀이 서술한 비배타적(非排他的)인 선종(禪宗)을 무시하였다.
그러나 종밀의 사상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진 고려 불교의 상황은 달랐다. 불교의 양대 산맥인 선종(禪宗)과 교종(敎宗) 사이의 갈등은 심각하였고, 어떠한 종파도 결정적으로 우위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고려의 대선사 지눌(知訥, 1153-1210)은 선종(禪宗)과 교종(敎宗)의 두 불교사상을 통합하고 화합하려고 하였다.
지눌(知訥)은 교종(敎宗)과 선종(禪宗)의 일치(一致)를 위한 기반을 닦기 위해 3년동안 불경을 연구하였다. 화엄경(華嚴經)과 8세기 중국의 해석학자 이통현(李通玄) 의 주석을 기초로 지눌은 선정에 든 부처의 마음과 불교의 교리적 가르침으로 발전된 부처의 말씀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였다. 이 두가지는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한 부처에 속한다.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한 부처 안에 있다. 선을 통해서 부처의 말씀이 반영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교의 교리적 가르침도 선을 통해서 얻어진 신비적 지식을 반영한다. 이 말은 교리에 의해 설명된 진리와 선(禪)을 통해 경험된 진리의 근본적인 종합을 의미한다.
지눌(知訥)은 선불교의 후기 발달사를 연구하였으므로 다른 사람과 달리 역사를 폭넓게 이해하였다. 더욱 지눌은 간화선(看話禪)으로 불리우는 임제종 (臨濟宗) 의 선사 대혜(大慧, 1089-1163)를 만났다. 임제종은 종밀이 결코 생각해보지 못했던 급진적인 선종의 한 부류이다. 당시에 지눌은 선종에 근거한 돈오(頓悟)와 교종에 근거한 점오(漸悟) 사이의 큰 차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지눌은 선종과 교종을 통합하는 새로운 길로서 돈오점수(頓悟漸修) 이론을 제시하였다. 가령 ‘점수(漸修)와 돈오(頓悟)’, ‘점수(漸修)와 점오(漸悟)’, ‘돈오(頓悟)와 돈수(頓修)’ 등 세 가지 대안이 있다. 지눌은 이 세가지 이외에 다른 방법은 말하지 않았다.
지눌은 모든 선사와 성인들의 발자취로서 돈오점수(頓悟漸修) 이론을 붙잡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눌(知訥)에 있어서 점수(漸修)는 지(知)와 행(行)의 사이와, 원리와 현상 사이의 간격을 극복하는 것이고, 돈오(頓悟)는 점수(漸修)를 참 수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참 수행은 무위(無爲)로 하는 것이지, 유위(有爲)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도교(道敎)의 삶에 대한 불교적 표현이다. 이러한 사상은 다음 4장에서 설명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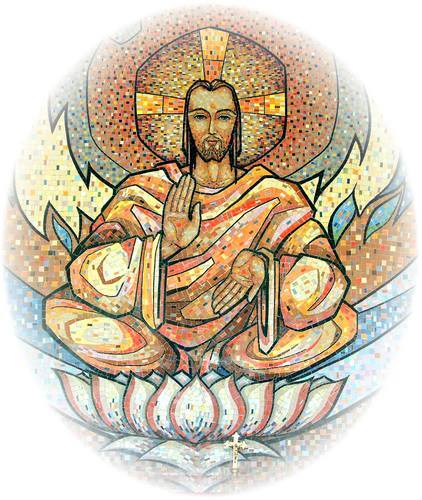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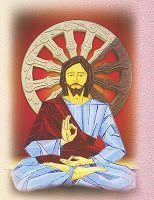
'마스터와 가르침 > 다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40) (0) | 2021.03.03 |
|---|---|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9) (0) | 2021.03.03 |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7) (0) | 2021.03.03 |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6) (0) | 2021.03.03 |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5) (0) | 2021.03.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