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터학당(學堂)-진리를 깨달아 자유를....나는 나다.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2) 본문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2)
박사논문
2015. 8. 25.
다석사상, 대아, 무아, 얼나, 없이 계시는 하느님, 유영모, 윤정현, 참나
성공회 수동교회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2)
3.2.3.1. 자아(自我), 무아(無我)와 대아(大我)
본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신비체험의 관점에서 스테이스(Stace)가 말한 자아(自我, self), 무아(無我, non-self) 그리고 대아(大我, universal self)에 대한 다석 유영모의 이해를 다루고자 한다. 깨달은 사람에 의해 실현된 자아, 곧 진아(眞我, true Self) 안에서 절대자인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다고 유영모는 말한다. 또한 사람이 ‘거짓 나’인 에고(ego)의 자아(自我)을 극복하고 진아 (眞我), 즉 영아(靈我 spiritual Self)를 얻으면, 깨달은 사람은 참 자아(眞我) 안에서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유영모는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은 ‘참 나’라고 말하였다.
“한아님이란 종당엔 ‘나’다. 참나(眞我)다. 하느님은 ‘참나’ 또는 ‘영아’(靈我) 안에 계시는 절대자를 깨닫는 것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다” 라고 이해한 유영모의 사고는 불교와 노장사상에서 말하는 체험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참나가 아닌 어떤 것이기를 바라는 아집의 자아(自我, ātman)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유영모는 말한다. 유영모의 하느님 체험은 거짓 자아로 가정되어 있는 모든 것을 벗겨내고 불교사상에 깊이 관계있는 무아(無我, anātman)를 찾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물에 집착하는 아집의 자아를 버릴 때, 참나(眞我)를 깨닫는다. 무아(無我)의 상태에 놓일 때, 참나를 깨달을 수 있다. 무아(無我)의 상태에 이른 사람은 모든 사물이 공(空)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까닭에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그러므로 무집착(無執着, non-attachment)은 무아(無我)의 상태를 얻기 위한 필연적 귀결이다. 이것은 참나가 완덕의 길에 이르도록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영모가 말하는 참나, 즉 얼나(靈我)는 무아(無我) 를 뜻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유영모의 무아(無我)의 개념은 불교의 무아론(無我論)과 통한다. 유영모의 무아(無我)의 사고는 앞에서 언급했던 깨달음의 신앙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만약 참나(眞我)가 자아를 부정하므로써 주어진다면, 또한 자아를 깬 사심없는 사람이 무아(無我)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때 본성(本性)의 실체 문제, 마음과 하느님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느님의 실체의 문제에 있어서 다석 유영모는 자기 의식으로부터 벗어난 대상으로 인식된 하느님을 발견할 때마다 모순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유영모는 ‘하느님은 …이다’라고 말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이해하였다. 쿠사의 니콜라스와 같은 서양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는 실재에 대한 순을 넘어서 이해한 사람이다. 니콜라스의 사고는 유영모의 견해를 지지해 준다.
이러한 관점으로 하느님을 보면, 하느님은 절대무(絶對無)이다. 하느님이 단지 무(無)인가 의심해야 한다. 그러나 확실히 그렇지만은 아니다. 하느님은 우주의 단일체이다. 하느님은 실체의 근거이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특별히 무(無)가 될 수가 있고, 하느님은 있지 않은 곳이 없고, 하느님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쿠사의 니콜라스에 있어서 하느님은 하느님 안에 ‘기원없은 기원’이다. 하느님 안에는 모든 것이 반대 개념으로 나타난다. 최대로서 하느님은 또한 최소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은 가장 작은 것과 가장 큰 것을 넘어서 계신다. 니콜라스는 안셈(Anselm) 이후 ‘하느님은 더 크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최고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신의 존재 증명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파악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특별하게 설명되고 파악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면, 일자(the one)는 이미 유한한 존재이고, 우주를 통합하는 무한성의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니콜라스의 하느님 개념은 모든 대상의 가장 높은 존재가 아니고, 정의할 수도 없고 묘사할 수도 없는 존재이다. 상상되지도 형상화할 수도 없는 존재로서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서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하느님은 연구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가운데 중에 가운데이고 목적 중에 목적이며, 상징 중의 상징, 존재 중의 존재, 비존재 중의 비존재이다”(Vom Nichtanderen, p. 87. theses 5). 니콜라스는 유(有)와 무(無)를 초월해 있는 하느님이라고 분명하게 주장한다. 하느님이 유(有)라면, 하느님은 또한 무(無)라고 니콜라스는 말한다. 자아 의식의 내면의 깊숙한 곳을 살펴볼 때, 우리는 하느님이 아무 것도 없는 ‘고요’이요, ‘심연’(深淵)이며, ‘대상 없는 의지,’ ‘깊은 어둠 속의 적막’ 등과 같은 말을 통해서 심오한 의미를 발견한다. 그럴때 우리는 숭고하고 신비로운 감정에 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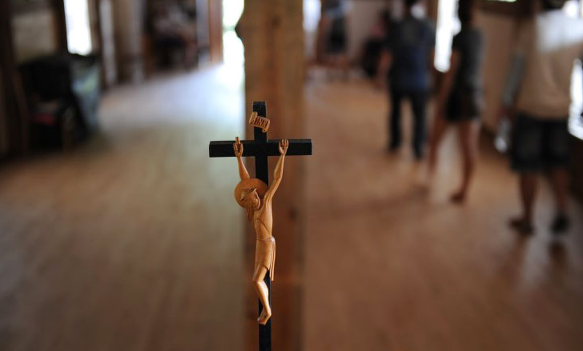
'마스터와 가르침 > 다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4) (0) | 2021.03.03 |
|---|---|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3) (0) | 2021.03.03 |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1) (0) | 2021.03.03 |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30) (0) | 2021.03.03 |
| 윤정현 신부의 논문 중 "하느님 이해"(29) (0) | 2021.03.03 |




